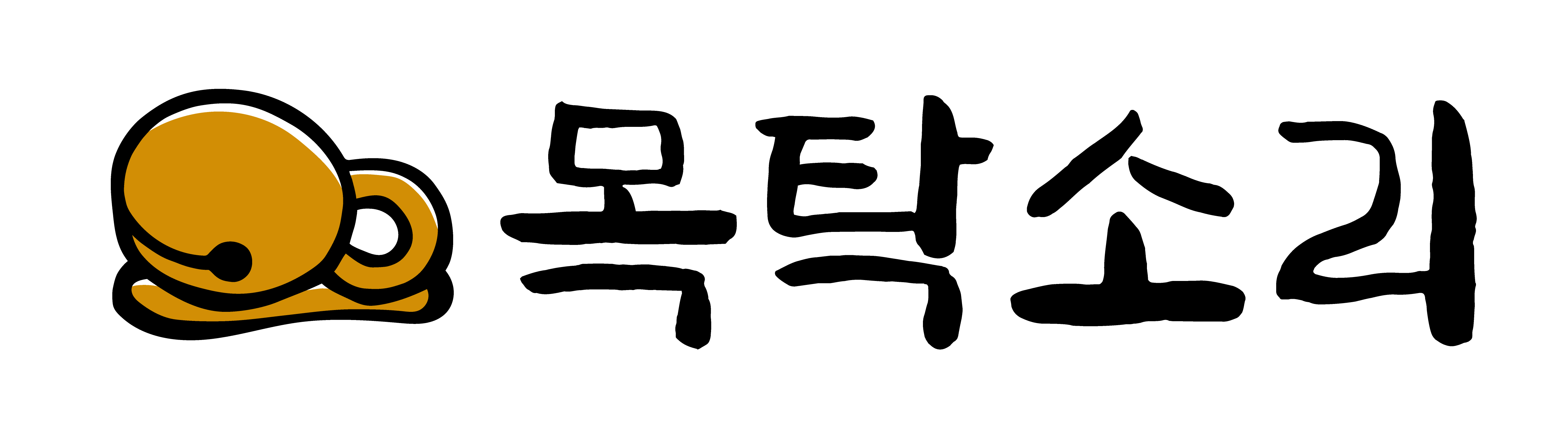길을 찾고 얼마 안 가 구루종(Ghurjung, 2050m) 마을에 도착. 잠시 롯지에서 평소에 잘 안 먹던 콜라를 한 병 시켜 의자에 앉아 에둘러 돌아온 길을 바라본다. 이렇게 휘휘 돌아 올 일은 아니었는데, 또 그저 산 중턱으로 난 소로길을 따라 오기만 했어도 비교적 평탄한 길로 무난히 올 수 있었는데, 저 깊은 계곡 아랫마을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온 것을 생각하니 꼭 우리 인생을 보는 듯 하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길을 걷는다. 다시 저 아래 계곡 킴롱코라(Kimrong Khola)까지 내려갔다가 다리를 건너 다시 저 건너편 산 위까지 올라가야 한다. 이제 좀 익숙할 법도 한데, 나도 모르게 헉 소리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다.
30여 분을 내려가고 다시 느릿느릿 1시간 이상을 걸어 오른다. 건너편 산 정상 부근에서 떨어지는 폭포수가 시원스레 내달려 계곡과 만나고 있다.
산 중턱 곳곳에는 어김없이 이 고산에서 몸 붙이고 살아가는 원주민들의 다랑이논과 밭들이 위태롭게 서 있다. 그 논밭 사이로 아스라이 자리 잡고 있는 시골집 마당에는 곡식이 햇살을 받아 일광욕을 즐기고 있다.
산정에 다시 올라서니 그 높은 곳에 거짓말처럼 넓고 푸른 잔디밭이 깔린 훌륭한 롯지가 장쾌한 전망을 바라보고 우뚝 서 있다. 찌아 한 잔을 마시고 다시 걷는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야생의 밀림이 시작된다. 숲의 나무들이 그야말로 사람의 간섭을 한 번도 거치지 않은 것처럼 자유분방하게 제멋대로 쭉쭉 뻗어있다.
제멋대로라고 했는데 사실 자연의 이 제멋대로 속에 인간의 질서를 넘어서는 자연 그 자체의 자연스럽고도 조화로운 질서가 저 졸막졸막한 가운데 종요롭게 스며 있다. 그래서 자연에 깃들 때는 인간의 가치판단이나 생각들을 한 켠으로 밀어재꺼두고 텅 빈 마음으로 하나의 자연이 되어 뛰어들어야 한다. 그랬을 때 비로소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연의 가르침을 느껴볼 수 있다.
저 숲의 무위(無爲)함을 보라. 저 거칠 것 없는 야생의 사자후를 들어보라. 말과 생각이 끊어진 이 천연의 산중에서 이렇게 글을 토해낸들 그것이 저 풀 한 포기의 떨림인들 담아낼 재간이 있겠는가! 그저 걸으며, 소담히 소요하며 침묵으로 바라볼 수 있을 뿐!
어느덧 파아란 롯지가 인상적인 타다빠니에 도착.
포카라에서 사들고 간 라면 하나를 비로소 여기에서 끓여 먹는다. 라만 끓여주는데 30루피, 밥은 다 못 먹는다고 엄살을 부리면서 반공기를 50루피에 시켜먹는다.
일찍 출발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일찍 타다빠니에 도착했고 점심식사도 12시 이전에 마쳤다.
오후에는 약 4시간 거리의 푼힐의 베이스캠프인 고라빠니까지 가는 일정이다.
엊그제 ABC에서 만난 중국인 두 명의 친구를 또 만난다. 나보고 ‘스트롱맨’이라고 엄지 손가락을 추겨 세우고 지나간다. 그야말로 요즘 네팔에서는 중국인들을 어디를 가나 무수히 만난다. 산에도, 포카라에도, 룸비니에서도 중국인들의 인해전술 같은 여행패턴은 파도처럼 밀려오고 밀려간다.
네필이 왕정을 끝내고 마오쩌뚱 사상을 표방한 마오이스트가 정권의 핵심으로 들어오면서 중국이 네팔을 거의 형제의 나라처럼 생각하게 되었던 영향이 크다고 한다.
타다파니에서 고라빠니까지의 길은 그야말로 야생화들의 천국이다. 곳곳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천연의 꽃들이 만개했다. 느릿느릿 걸으며 꽃들을 사진에 담아본다. 야생화의 숫접은 생경함에 취할 지경이다.
야생화 군락과 몇 백년도 더 되었을 법한 야생숲의 엄숙함을 뚫고 말인지 야크인지 안나푸르나의 물자 이동수단인 가축떼가 싱그러이 지나간다.
두 빠니 사이의 중간 즈음이 되었으려나, 계곡물이 청연히 흐르는 무릉도원이 나타나더니 그림 같은 롯지가 나타난다.
잠시 쉬어 사과 하나를 사서는 한 입 베어무는데 종작없는 소나기가 내리는 것이 아닌가. 후두둑 비 피할 시간도 주지 않고 폭포처럼 떨어지는 소나기에 깜짝 놀라 여유롭게 오후의 나른함을 즐기던 여행자들이 비좁은 롯지 식당 안으로 일제히 뛰어든다.
어둑어둑하던 롯지 식당이 순식간에 활기를 띄면서 밝아진다.
그저 지나가는 소나기다. 그것도 고작 5분 여를 넘기지 못하고 소락소락하게 오다 말고 가 버렸다. 비 옷을 꺼내 단단히 싸메 입다 말고 다시 접어 넣는다. 덕분에 계곡의 초록 생명들은 수런수런거리며 활기를 되찾는다. 시그러지던 계곡물도 생기를 띄며 속도를 내기 시작한다.
나도 이제 마지막 오르막을 걸어오를 채비를 마친다. 어둑어둑한 계곡물을 따라 오르다가 이내 계곡과는 작별을 고하고 능선으로 접어든다. 새로운 꽃이며 풀들이 반갑다는듯 홀연한 바람을 만나 손을 흔든다.
점심 즈음에 다다르니 비로소 구름 사이를 뚫고 잠시 햇살이 오랜 숲에 부서져 반짝인다.
길을 걷다 보니 다시 한 번 마을이 나타난다. 마을이라고 해 봐야 고작 롯지와 식당을 겸해서 운영하는 집 두어 채 있는 것이 전부지만, 이 곳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내어 놓고 길 가는 여행객들의 시선을 잠시 잡아끌고 있다.
숲을 빠져나가니 황량한 너른 들판에 휭하니 차고 외로운 바람이 불어온다.
저 머얼리 구름과 숨바꼭질이라도 하듯 아련한 설산의 봉우리들이 그 모습을 보여줄듯 말듯, 숨었다가 고개를 내밀곤 한다.
이 황량한 정상에 작은 구멍 가게 하나! 이 인간의 끈질긴 생명력이라니!
또 한번 길 위에서 걸음을 멈춘다. 난감한 갈림길.
도대체 어쩌자고 이 나라에서는 세계 도처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한 갈림길 이정표 하나 만들어 놓지 않았단 말인가. 이 또한 어쩔 수 없는 일. 보통 상식 수준에서는 이렇게 이정표 없는 갈림길은 어느 곳으로 가도 길은 통한다는 무언의 암시이기 쉽다. 물론 이 또한 한국에서의 이야기다.
네팔은 어디까지나 네팔이니 이 나라의 상식을 알 길이 없다. 더구나 이 갈림길은 정확히 90도 직각으로 난 전혀 다른 길이 아닌가!
조금 앉아서 숨도 돌릴 겸 혹시나 뒤따라올 다른 여행자를 기다려 보기로 한다. 거의 대부분 여행자가 포터나 가이드를 동반하고 있으니 물어가면 될 것이란 예상이 보기좋게 빗나가며 나의 숨돌림은 30분을 넘어서고 있다.
그냥 직관으로 가야겠다고 발길을 옮기려는 순간 그 길 반대편에서 네팔 현지인 3명이 걸어올라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후다닥 내려가 물었더니 역시나 이 길이 고라빠니 길이다. 물론 예상했던 것처럼 다른 길로 가더라도 돌아가기는 할지언정 고라빠니에 도착하는 길이라는 것도 알았다.
20여 분을 걸어 내려가니 드디어 고라빠니.
고라빠니의 롯지에서 주인과 얘기를 하다가 오늘 내가 온 길이 남들은 이틀을 걸어오는 길이었음을 듣고는 노곤한 피로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고라빠니에 어둠이 내린다. 어둠과 함께 곧장 잠에 떨어진다.
'희말라야 명상순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미 누들 수프 (3) | 2016.05.16 |
|---|---|
| 히말라야의 별, 깊이 바라보다 (0) | 2016.05.11 |
| 나를 돕는 신비로운 존재들 - 안나푸르나 순례(9) (0) | 2013.02.28 |
| 하산, 아! 이 낯선 외로움 – 안나푸르나 순례(8) (0) | 2012.08.27 |
|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에서의 하룻밤 – 안나푸르나 순례(7) (0) | 2012.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