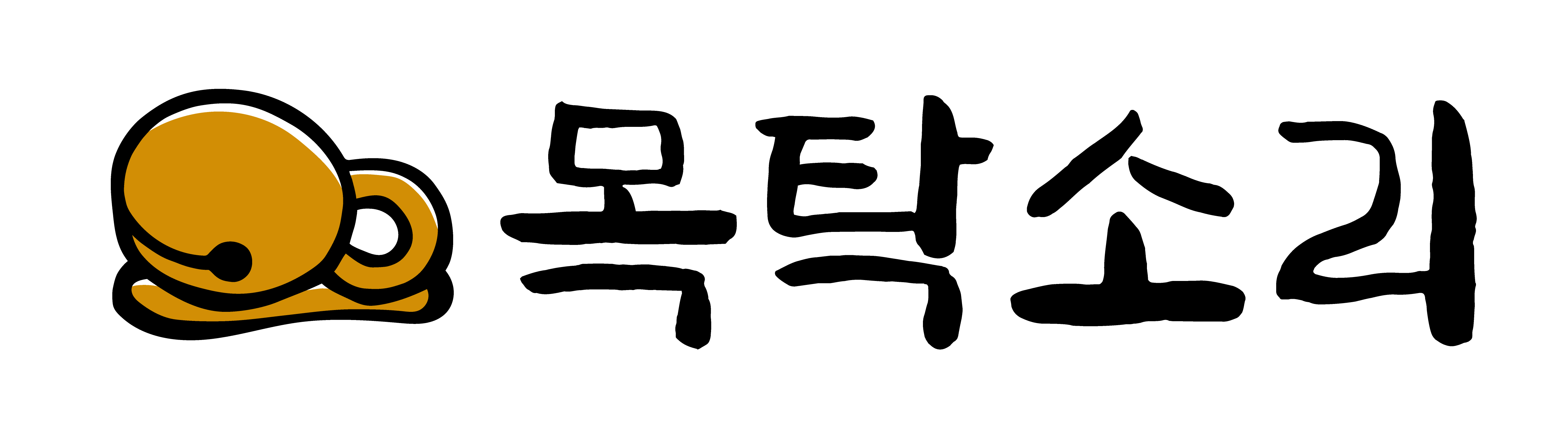안나푸르나를 오르던 날이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걷고 또 걷다보니 뒤늦게 점심식사를 하지 못한 생각이 났다. 배시계는 꼬륵꼬륵 자명종을 울려댄다. 한참을 걷다보니 작은 간이식당이 보여 반가운 마음에 요기를 하기로 한다. 딱히 메뉴랄 것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 허름하고 지저분한 식당에서 특별한 것을 주문할 생각도 없고 또 시간도 없고 해서 그저 간단히 ‘누들스프’라고 쓰여 있는 우리말로 ‘라면’을 주문한다.
기다리다가 잠시 주방을 구경하러 들어갔더니 눈에 들어오는 풍경! 설거지도 하지 않은 아마도 이전 사람에게 음식을 해 주던 것 같은 냄비에 그대로 물을 붓고 끓이기 시작하는게 아닌가. 순간 황당한 마음이 일어났지만 인도에서 그랬듯 이 정도야 그냥 지켜봐주며 웃어넘기기로 한다. 여기는 네팔이 아닌가.
인도에서 만났던 한 여행자는 제게 “인도에서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하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이 라면 역시 기대에 부응하는 상상이하의 라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더한 것은 그 곁에 있던 전에 쓰던 씻지 않은 국자, 개미들이 다닥다닥 붙어 음식찌꺼기를 먹고 있는 것이 눈에 훤히 보이는, 설마설마 했던 그 국자가 곁에서 “잠깐!” 하고 소리 지를 틈도 없이 그냥 냄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 즈음에서 아예 포기를 하고 차라리 보지를 말자는 심정으로 제 자리로 돌아가 앉는다. “휴~~ 그래 여기는 네팔이니까”
이 한마디로 한국에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던 너무도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용납이 되고 받아들여진다. 결국 내 앞에 배달된 네팔 라면 한 그릇에는 포크를 들 때마다 면발 사이 사이로 보일 듯 말 듯 숨바꼭질하듯 작은 개미들의 시신이 입속으로 빨려들어 간다.
“아~! 관세음보살”
해외 여행길에서 배우는 것이 어쩌면 이런 건지도 모르겠다. 우리나라에서 견고하게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다른 나라에 가면 꼭 그렇지 만은 않을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당연한 상식조차 다른 어떤 나라에서는 전혀 상식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에게는 경악할 만한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
‘이 사람들 참 더러워 죽겠네’ 라고 할 만하지만 이 사람들은 반대로 한국 사람을 보고 더럽고 비위생적인 사람이라고 경악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런 음식 먹는 습관이나 조금 전 부엌의 상황과 같은 이런 더러운 모습에 놀라지만, 네팔인들은 한국인들이 달밧 하나를 시키고 또 무슨 국이나 수프를 시키고 또 볶음면 같은 프라이드 누들 등을 시켜 각각 자기 것을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펼쳐 놓고 다같이 먹는데서 기절을 한다.
그러니 더럽다거나 깨끗하다는 관념도 다 제 생각하기 나름이 아닌가 싶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불구부정(不垢不淨) 아닌가.
여기 사람들처럼 애고 어른이고 매일 숲에서 들에서 일하고 흙을 만지다가 그 손으로 밥을 먹는 것이 더 더러운가, 아니면 깨끗하게 하겠다고 손에 온갖 크림을 바르고, 지하철, 버스, 공중화장실, 곳곳의 위생적인 현대 시설과 현대적 기계와 자동차, 매연, 가스, 분진 등을 수북이 덮어 쓴 손이 더 더러운가.
이 즈음에서 세상의 옳고 그름이라는 것의 경계가 불분명해진다. 우리에게서 옳은 것이 반드시 저들에게도 옳아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여행을 통해 서로 다른 것이 꼭 옳고 그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차이점일 뿐임을 겸허히 수용하게 됩니다.
[BBS 불교방송 '법상스님의 목탁소리' 중에서]
'희말라야 명상순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트레킹(2) 남체~텡보체 (0) | 2019.02.28 |
|---|---|
| 에베레스트 고쿄 트레킹(1) 카투만두 - 남체바자 (0) | 2019.02.26 |
| 히말라야의 별, 깊이 바라보다 (0) | 2016.05.11 |
| 야생의 숲길을 걷는 즐거움 - 안나푸르나 순례(10) (1) | 2013.03.12 |
| 나를 돕는 신비로운 존재들 - 안나푸르나 순례(9) (0) | 2013.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