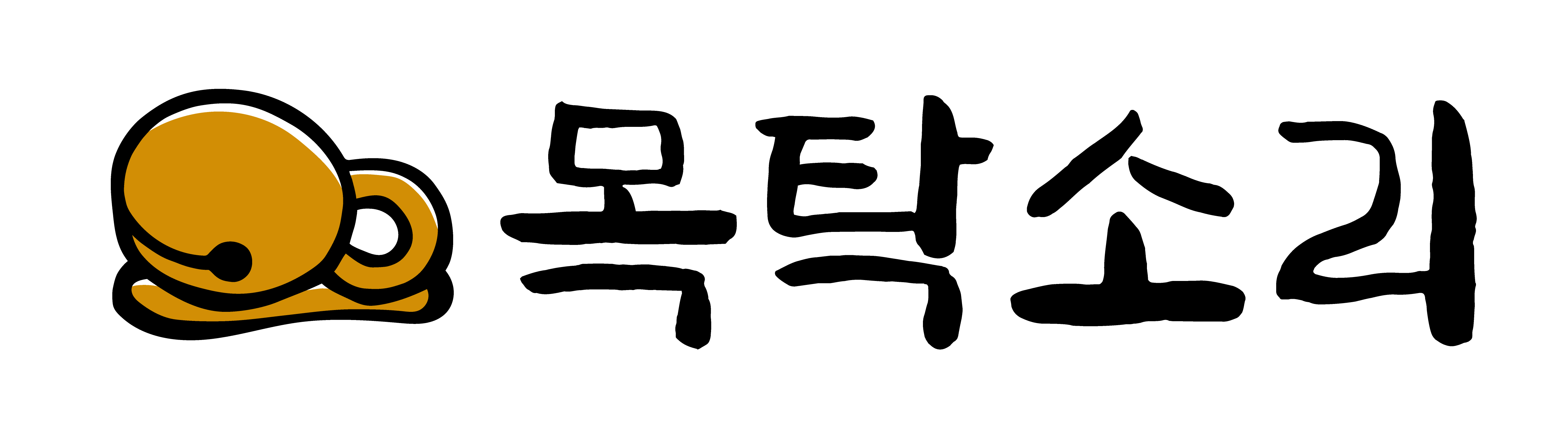히밀라야 일출을 기다리며
그 어떤 날보다 일찍 눈을 뜬다.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에서 보는 일출, 그것을 어둠이 채 거치기도 전부터 하나하나 누려본다. 롯지는 여전히 어둡고, 하늘의 별은 선드러지게 빛난다. 후레쉬를 켜고 롯지 뒤편 작은 언덕에 오른다.

아직 밝아지기 전인데도 이 찬 공기를 마다않고 많은 여행자들이 눈 부비며 이불을 막차고 나와 있다. 이 곳에서의 일출이나 일몰이라는 것은 사실 직접 태양이 산 너머로 뜨고 지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저 머얼리 어딘가에서 뜨고 지는 태양이 그 빛을 설산의 영봉들에게 나누어주는 붉은 의식을 보는 것이다.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이 대지위 가장 높은 곳부터 붉은 은총이 시작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가장 높은 봉우리 끝자락에 붉은 점이 찍히다가 서서히 그 점이 아내로 향하면서 봉우리 전체를 밝그레한 새색시의 순후한 낯빛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다.

강가쥴리의 일출이 구릉족들의 염원을 담은 룽다의 푸두둥거림과 묘한 조화를 이룬다. 그렇게 한참을 봉우리의 빛 잔치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가 문득 고개를 돌리면 아연하게 주변 전체가 밝아져 있음을 본다. 이 황량한 신비속에서 세상이 아직 깨어나기 전에 가장 먼저 첫 아침을 맞이하는 소회에 젖어든다.

이 아침에 또 다시 빙하가 무너져 내리는 굉음 같은 것이 머얼리서 마치 사자의 표효처럼 들려온다. 아! 이 소리는 내 삶에서 그간 들어왔던 그 어떤 소리와도 견줄 수 없는 일종의 두려움을 동반하는 경외감이다. 문득 저 빙하를 무너뜨렸을 법한 황량한 소소리바람이 스쳐간다.

아, 이 낯선 외로움!
아! 이 낯선 외로움!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치 않은 설면한 것들이라 이 외경의 새로움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기가 힘에 겹다. 그러나 삶의 신비는 이토록 역설적인 것인가. 낯선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알수 없는 익숙함과 어머니 우주의 자궁과도 같은 고향의 내음이 들려온다.
그러면서 순간, 지금 이 자리가 낯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그리 길지 않았던 내 삶의 여정이 문득 낯설게 느껴진다. 한국이라는 내가 살아온 익숙한 고향에서 잠시 이 곳으로 순례를 떠나 온 여행자가 아니라, 이 곳에서, 내 태속과도 같은 숭고한 이 귀의처에서 영겁을 살아오다 잠시 한반도라는 작은 땅을 여행하고 되돌아 온 귀향인이 된 듯한 착각 속에 빠지곤 하는 것이다.

어쩌면 그것이 맞는 것인지도 모른다. 또 어쩌면 하룻밤 꿈속에서 지금까지의 한 생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여전히 꿈에서 깨지 못한 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순간이 한 순간의 꿈이 아니라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단 말인가. 사실은 우리 모두가 꿈을 꾸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현실인식인지 모른다.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실제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꿈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이 도대체 하나라도 있단 말인가! 내가 목숨 걸고 지키려고 발버둥치며, 소유하려고 애써왔던 그 모든 것들이 꿈처럼 언젠가는 사라지고야 마는 것들 아닌가.
그간의 삶에서 구축해 왔던 견고한 모든 것들, 내 소유, 내 명예, 내 집과 재산, 내 사랑, 내 가족, 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혀 견고하지도, 오래 지속되지도 않는 꿈과 같고, 신기루와 같은 것이 아니던가! 그런 것들에 우리는 너무 집착해 왔고, 쓸데없이 에너지를 쏟아왔으며, 그 허망한 것을 지켜보고자 때로는 남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속이고, 심리적, 물질적 폭력을 가해 온 것은 아닌가.

10시간 하룻밤 잠 속에서 꿈꾸는 것과, 100년도 안 되는 시간 삶 속에서 꿈꾸는 것이 사실 시간을 초월한 더 깊은 차원에서 본다면 매한가지 일 뿐이다.
우리는 과연 이 삶이라는 꿈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꿈을 깰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믿어왔던 이것이 꿈 속의 존재라면 과연 꿈 깬 나는 누구란 말인가?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이뭣고!
하산, 일출을 뒤로하며
활화산 같은 화두를 품고 타박타박 아쉬운 발걸음을 옮긴다.

그저 걸을 뿐. 그저 다음 발자국에만 주의를 모으며 걷다보니 어느덧 촘롱이다. 걷고 있다는 이 순간의 움직임, 그 자체를 고스란히 받아들인다. 걷는다는 것은 그저 걸을 뿐이지 어떤 도착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느 목적지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며칠까지 산행을 끝내고, 몇 시까지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걷는다면 우리는 그 순간 참된 걷기를 잃고 만다.

걷는 목적은 그저 그 한 발자국의 옮김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도착을 위해 걸을 때 우리는 걷는 그 순간에 존재하지 않으며, 그 걸음에는 어떤 힘도, 어떤 지혜도, 어떤 아름다움이나 자비로움도 내포되어 있지 않다. 걸음 그 자체로써 걸을 때 걷는다는 단순한 행위는 성스러운 영적 수행의 길과 다르지 않다. 걷는 그 순간 우리는 바로 거기에 있으며, 과거나 미래나 혹은 다른 공간이 들어설 틈이 없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차별적 사고에서 벗어나 오직 '지금 여기'에서 다만 걷고 있을 뿐이다.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성스러운가. 절이나 교회에서 정기적인 기도회에 참석해 예배를 올리는 행위가 이보다 더 신성하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단순간 걷는 행위가 얼마나 신성해질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느낀 하루!
올라갈 때를 생각하면 이틀에 걸쳐 오른 길을 내려올 때는 단박 하루 만에 내려오고도 별로 힘이 들지 않는다.





촘롱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엊그제 밤에 묵었던 옆 롯지에 들어가 씻고는 한가로이 마을을 산책한다. 어둠이 마을 전체에 깃들고 저녁식사를 마친 뒤 롯지 식당에 앉아 책을 읽는다. 그런데 무슨 사물놀이 하듯 흡사 북치고 장구치며 꽹과리를 부는 소리가 어스라히 들려온다. 무슨일인가 싶어 마을길을 걸어내려갔더니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제를 열고 있다. 나팔을 불며 여인네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 이 마을에 사는 구릉족들의 페스티발이다. 외국인 여행자들도 함께 모여 흥겨운 잔치에 동참한다.
'희말라야 명상순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야생의 숲길을 걷는 즐거움 - 안나푸르나 순례(10) (1) | 2013.03.12 |
|---|---|
| 나를 돕는 신비로운 존재들 - 안나푸르나 순례(9) (0) | 2013.02.28 |
|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에서의 하룻밤 – 안나푸르나 순례(7) (0) | 2012.08.27 |
| 새로운 행성, 마차푸차레 베이스 캠프 – 안나푸르나 순례(6) (0) | 2012.08.11 |
| ‘쨍!’하는 적연부동의 순간 – 안나푸르나 순례(5) (1) | 2012.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