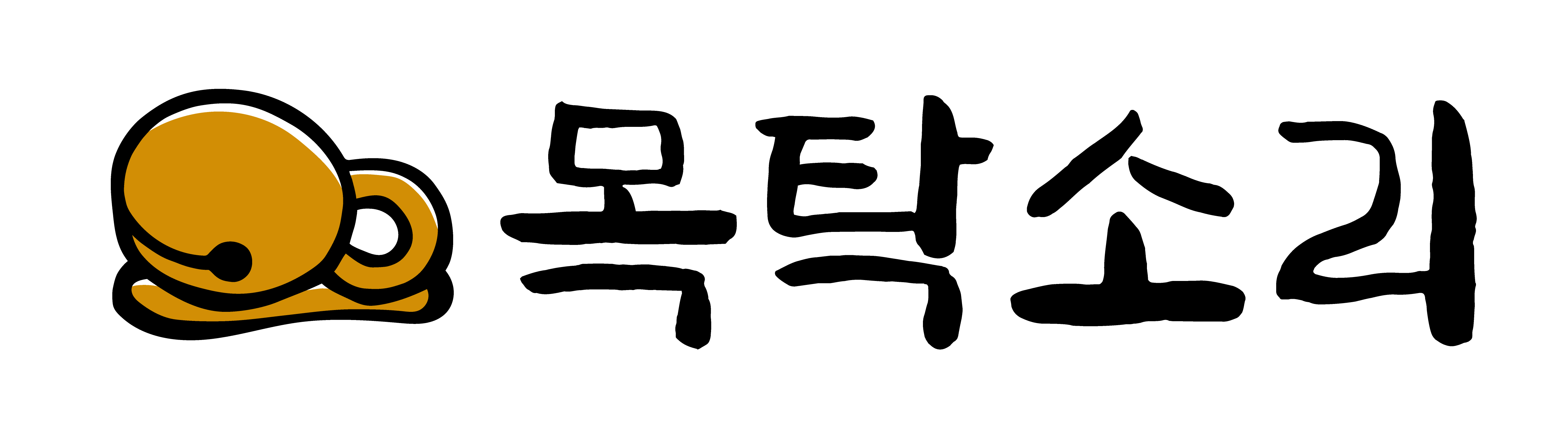한번도 만나보지 않았고
한번도 가보지 않았을 지라도
왠지 모를 아련한 향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있다.
내 삶의 기억에서
그 어떤 추억거리를 만들어 준 것도 없고
그렇다고 많이 배워 잘 아는 것도 아니지만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싸~해지면서 조금은 외로운
또 조금은 아련한 느낌을 가져다 주는 것.
이를테면
대학시절의 지리산이 그랬고,
또 지금에는 인도가 그런 곳이며,
강원도 정선이라던가,
전라도의 해남 같은 곳이 그런 곳에 속한다.
그런데 또 하나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내 가슴을 설레게 해 주던 꽃이 하나 있다.
그게 바로 동백꽃...
그냥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거니와
언젠가 기차 안에선가
잡지책에서 보았던 하얀 눈 속에 붉은 동백의 사진이
더욱 내 가슴을 들뜨게 해 준 기억이 있다.
사실 이번 만행길을
전라도 남쪽나라 쪽으로 잡는데도
동백꽃의 향수가 자리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물론 오월에 웬 동백꽃 타령인가 마는
그래도 왠지 그곳에 가면
뚝 떨어져 있는 꽃송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도 아니라면 다 떨어지고 다 헤어진
붉은 자취만이라도 볼 수 있으면 하고 바랬는지도...
동백이란 녀석은
아직 하얀 눈이 채 녹기도 전에
흰 눈 속에서 가장 먼저 피어나 봄을 알리는
봄의 전령사다.
세상 모두가 긴긴 겨울밤 고된 추위로
몸을 움크리고 있을 때,
따뜻한 봄의 소식을 차분히 기다리고 있을 때
그 때 불쑥 피어올라 계절의 뱃전에서
만물을 봄으로 안내하는 흡사 인로왕보살의 모습을 하고 말이 다.
더구나 그 꽃의 모양이며 색깔은
얼마나 정열적인지...
무엇보다도 동백의 아름다움은
한창 아름다움이 그 최고조에 달할 때
바로 그 때
아무런 미련도 없이
꽃송이 채로 뚝 떨어지는데 그 멋이 있다.
한 잎 두 잎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번에 뚝 떨어지는 것도 그렇지만,
한참 아름다움을 뿜내며 피어올랐을 때
아무런 미련도 없이
그 생기어린 고개를 뚝 떨구며 땅으로 돌아간다.
그러고 보면 우리들은
그런 동백 앞에서 부끄러운 점이 많다.
사람도 동백처럼 한참 아름다움을 꽃피우다가도
제 삶의 때를 잘 알아
스스로 물러날 줄 알아야 하고,
그 어떤 아름다움일지라도 버릴 땐 버릴 줄 알아야 한다.
때를 넘기도록 계속 가지려고 애쓰면
그건 아름다움이 아니라
되려 삶의 추한 모습으로 기억될 뿐이다.
요즘 사람들이야
'내가 한창때는...' 해 가면서 그 때를 잊지 못하고,
억지로라도 그 아름다움을 오래도록 간직하려 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아름다움을 유지시키려고
심지어 추하고 썩은 행동도 마다하지 않는다.
산을 오를 때에도
한참을 땀흘리며 오를 때가 있고
오른 뒤에는 잠시 쉬면서 즐길 때가 있지만
그러고 나면 어김없이 다시 내려가야 하는 법.
정상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하산하지 않고 그곳에만 있게 된다면
그건 집착이지 정상인의 모습이 아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떨어질 때가 있는 법이고,
썩어갈 때가, 늙어갈 때가 있는 법이다.
늙는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썩는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조금씩 자취를 감춘다는 것은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물론 부처님오신날이 지난
푸르른 오월 중순까지 동백이 피어있을 리 만무하다는 생각이지만
혹시나 싶던 마음을 그나마 위로해 준 곳이 도갑사.
도갑사도 도갑사지만
산사람들의 입이 마르던 월출산 자랑에
가던 길을 멈추고 들렀다가
뜻밖의 동백을 만나고는
몇 번이고 내 눈을 의심했었다.
일찍 찾아 온 더위
그 무더위 속에 아직까지 지지 않고 남아 있는 동백꽃이라 니...
도갑사 일주문을 지나 숲길을 잠시 걷다 보면
천왕문 앞으로 동백나무 몇 그루가 아기자기하게 피어있다.
물론 다 떨어지고
그나마 한 두 송이 어렵게 찾아낸 것이지만
반가운 마음도 잠시
이 녀석들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 도반들 때 맞춰 다 떨어질 때
조금더 조금더 하며 남아 있던 흔적이
꽃잎에서 느껴져 조금은 안스런 마음이 들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대둔사로 들어가는 입구.
부도탑을 지나 해탈문에 이르기 전
내 마음 속에 자리하고 있던 때지난 동백의 흔적이
마음 속 풍경 그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썩어가고 있었다.
한참을 바라보며
고개를 떨군 동백의 아름다운 영혼을 위해 기도했다.
그 모습은 죽어가는 이의 처절한 뒷모습이라기 보다는
본래 자리에서 나왔다가
조용히 한 철을 나고,
때가 되어 다시금 자신의 자리로 되돌아 가는
올곧은 수행자의 참된 귀의의 모습이다.
보성 차밭에 잠시 들렀다가 잠자리에 들면서
내 말년 모습도 저런 아름다운 모습이길 빌었다.
그리고 다음 날
여수 돌산의 향일암으로 발길을 돌렸다.
향일암...
시원하게 펼쳐진 바닷가 위로
우뚝이 서 있는 차분한 암자, 향일암
향일암은 동백의 절이다.
그 아름답고 시원한 암자를
동백의 정열적인 기상이 감싸고 있다.
물론 지금은 다 떨어져 지고 없지만...
대웅전 부처님 전에 삼배를 올리며
동백이 한창일 때
혹은 동백의 낙화가 진행중일 때
그 때의 향일암의 정취를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대웅전을 나오는데
그곳에서
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마음속에 품었던 향일암 동백의 옛 모습을 보았다.
신기하게도 다른 모든 나무의 꽃들은 다 떨어져
연한 자취만을 남기고 사라져 버렸는데
유독 대웅전 옆 한 그루에서만
아직 동백의 아름다움은 진행되고 있었다.
알 수 없는 일이다.
분명 다른 나무들에서는 아무런 흔적도 찾기 어려운데
이 나무 한 그루에서만 활짝 피어오른
한참 물이 올랐을 법한 아름다운 꽃송이들이
나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때를 맞춰 활짝 웃어 주는지...
향일암을 내려올 때
하늘에서 가는 빗줄기가 함께 내렸다.
아마도 마지막 남은 동백이
제 할 일을 마치고 이제 가야할 때가 되었나 보다.
빗물 흠뻑 머금고
그 무거운 고개를 뚝 떨구겠지.
'스님따라 여행가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지리산 기행(화엄사에서 벽소령까지) (0) | 2011.06.15 |
|---|---|
| 눈덮인 태백산과 외로운 산사 (4) | 2011.06.15 |
| 인도 델리 배낭여행의 황당한 첫 날 (1) | 2010.01.07 |
| 1박2일, 울릉도 일몰과 일출 (0) | 2009.12.03 |
| 울릉도 성인봉, 가을 가고 겨울 오다 (0) | 2009.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