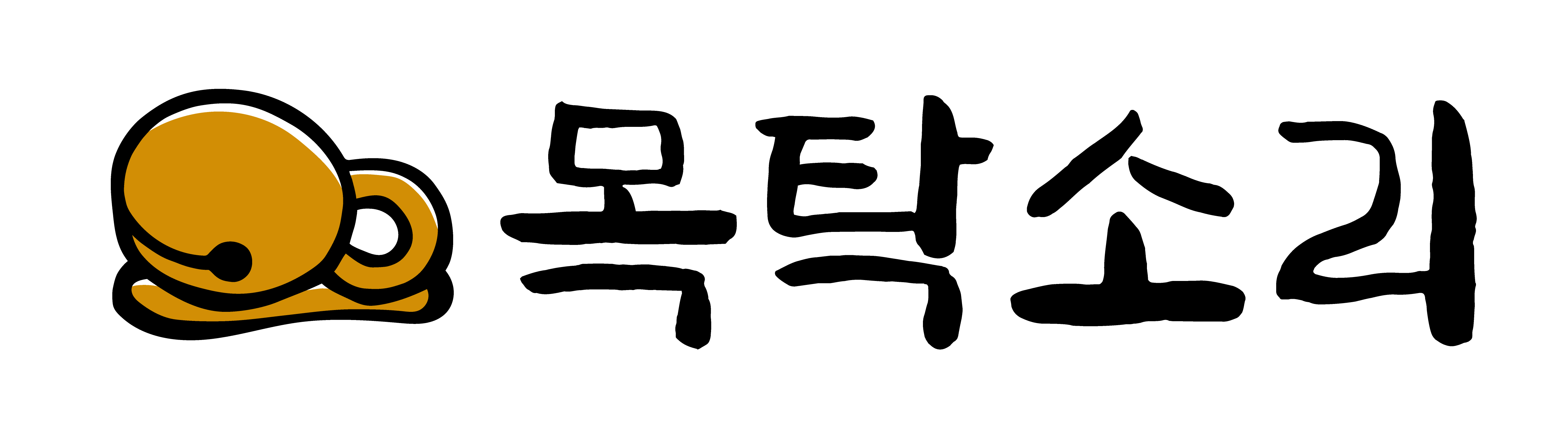| [구례 사성암과 사성암에서 내려다 본 구례, 오른쪽 산이 지리산] 나와 너를 나누고 있고, 안과 밖을 나누며, 좋고 싫음을, 옳고 그름을 나누고는 있지만 존재의 실상은 아무런 나뉨도 차별도 없다. 제 멋대로 나누어 놓고 스스로 나눈 대로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하면서 분별하고 그 분별에 따라 행복하고 괴롭다고 생각하는 것일 뿐. 실상의 모습은 그냥 그냥 여여할 뿐이다. 우리 몸을 생각했을 때 우리 몸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 내 몸 밖의 대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몸도 외부의 대상도 그냥 여여하기만 하다. 안팎의 분별이라는 게 참 공허한 것이다. 이 법계에서 본다면 안이라는 것도 밖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호흡을 할 때 코를 통해 바람이 움직일 뿐. 그저 저쪽 산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와 우리 뺨을 스치고 다시 다른 쪽으로 불어가듯, 우리 몸 또한 코를 통해 그저 바람이 인연따라 불어오고 불어가고 아니, 불어온다 간다도 빼고 그저 그렇게 움직일 뿐이다.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우리 목숨도 없어지는 것 아닌가. 바람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그 코의 기능이 사라지는 순간 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저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을 확인할 수 있다.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보고 살아있다고 규정짓고 있을 뿐인 것이다. 우리는 코를 통해 바람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게 내가 호흡을 하고 숨을 쉬며 살아있음을 느끼고, 그것이 끝나버리면 죽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지만, 법계의 입장에서 본다면 들어오고 나가고 할 것이 없다. 숨을 쉬고 내고 한다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 낸 말일 뿐, 법계에서는 그저 고정된 실체 없이 공하게 인연따라 바람이 불고 있을 뿐이다. 우리 몸의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나’라고 느끼고,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 몸 밖의 여섯 가지를 ‘대상’이라고 규정짓고, 그렇게 안팎을 나누고, 나와 남을 나누고 있을 뿐이다. 눈으로 대상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거나 호흡을 하고, 혀로 맛을 보거나 음식을 먹고, 몸으로 촉감을 느끼고, 뜻으로 온갖 분별을 일으키면서 그 여섯 가지가 나인 줄로 착각하고, 그 대상들이 상대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계의 실상은 나와 너도 없고, 눈귀코혀몸뜻이나 색성향미촉법도 없으며, 다만 공한 모습들이 인연따라 환영처럼 신기루처럼 펼쳐질 뿐이다. 반야심경에서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이라고 한 말이 바로 그 뜻이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수행이다. 나와 내 밖의 대상이 다 공한 것임을 그래서 본래에는 나도 너도 없고, 생사도 열반도 없으며, 중생과 부처 또한 다 공했음을 관하는 것이 수행이다. 그래서 참선에 들 때에는 안도 밖도 없다. 참선에 들어 있는 순간은 내가 없다. 다만 우리 몸의 기관을 통해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 뿐. 다만 그러한 변화를 알아차릴 뿐이다. 그래서 호흡 수행이 중요한 것이다. 참선 수행을 할 때는 나도 없고 상대도 없이 오직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릴 뿐이다. 이러한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것이야말로 법계의 성품을 깨닫는 기본 수행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알아차림 없이는 결코 대자유를 체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염불수행을 할 때 불명을 염하는 그 소리를 잘 관하라는 말도, 절 수행을 할 때 몸의 움직임을 잘 알아차리라는 말도, 좌선 수행을 할 때 호흡을 잘 관하라는 말도, 경행 수행을 할 때 걸음 걸음을 온전히 관하라는 말도 다만 그것을 알아차림으로써 안팎이 따로 없음을, 다 공했음을 깨닫기 위한 수행이다. 우리 몸의 여섯 기관들은 다만 나와 대상을 이어주는 문일 뿐이다. 그러나 그 문에는 안과 밖이 따로 없는 문이라고 이름지을 것도 없는 그저 인연따라 열리고 닫기는 공한 문일 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는 실체가 이러한 것이다. 실제로 내가 있고, 상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여섯 기관을 통해 이 법계가 인연따라 변화해 가고 있을 뿐인 것이다. 바로 이 여섯 가지 기관을 가지고 우리는 ‘나’라고 이름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여섯 가지 기관이라는 문의 안과 밖이 모두 공하다. 우리 몸도 공하고, 바깥 대상도 공하다. 또한 여섯 가지 기관이라는 것도 그저 공할 뿐이다. 그러면 남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 것도 없다. 그저 텅 비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섯 가지 여닫이 문을 잘 관하고 그 여섯 가지 기관으로 들락날락하는 것들을 잘 관해야 한다. 수문장이 졸고 있으면 성 안에 있는 온갖 금은 보화를 누가 훔쳐가는지 어찌 알겠는가. 여섯 가지 우리 몸의 기관을 잘 관하지 않고 놓치고 산다는 것은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다. 이 여섯 가지 기관을 졸지말고 잘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 육신의 기관도 실체가 없고, 대상도 실체가 없으며, 오고 가는 것 또한 실체가 없다. 다만 변화할 뿐이다. 움직일 뿐이다. 실체 없이 인연따라 다만 변화해 갈 뿐이다. 바로 그 움직임, 변화를 놓치지 말고 알아차려야 한다. 그랬을 때 안팎이 따로 없는 온 우주 법계의 본래 성품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알아차릴 때 우리 몸은 깨어있다. 우리 몸은 가장 이상적인 기운으로 넘친다. 우리 몸이 온전하게 살아나게 된다. 그대로 우주 법계의 법신불로 화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성 안의 모든 것들도 공하고, 성 밖의 모든 것들도 공하며, 성문으로 들고 나는 모든 것들 또한 공하고, 성문이라는 자체 또한 다 공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
728x90
반응형
'마음공부 생활수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다리지 말라 매 순간 도착해 있으라 (0) | 2009.09.18 |
|---|---|
| 오직 깨어있는 행위만 있다 (0) | 2009.09.15 |
| 신념이 만드는 세상은 가짜다 (0) | 2009.09.10 |
| 선택하지 말고 다만 바라보라 (0) | 2009.09.09 |
| 화를 다스리는 명상법 (0) | 2009.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