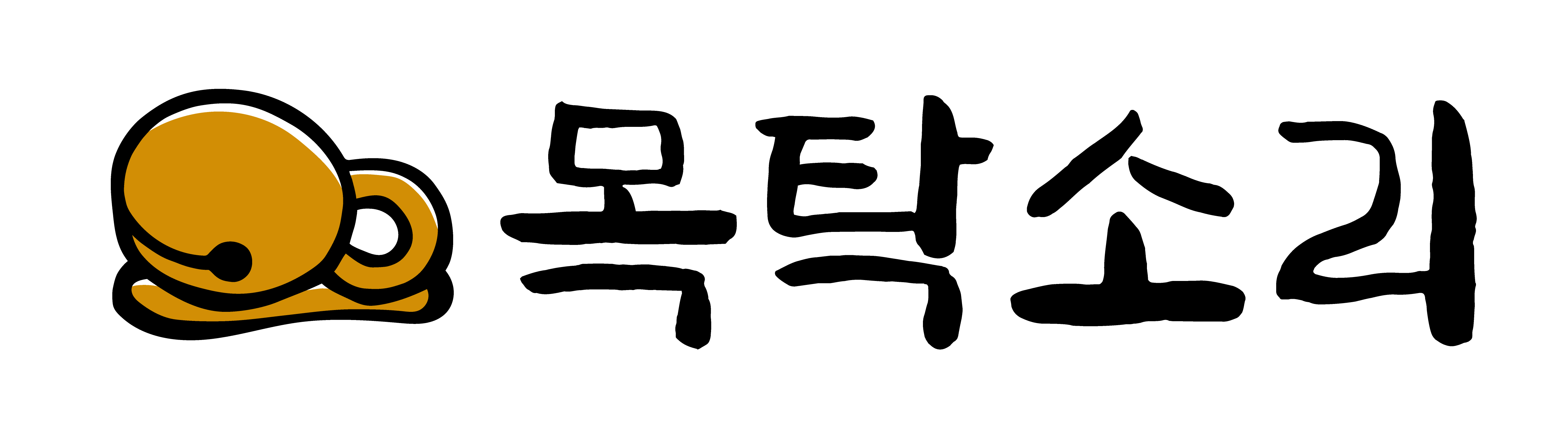|
||||||||||||
|
||||||||||||
마음 속에서
이따금씩 그리움이 피어오를 때,
또 내 스스로 만들어 둔 틀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속 뜰의 얽매임을 볼 때,
그럴 때면
이것 저것 따질 것 없이 길을 나선다.
길을 나선다는 것은
단순히 몸뚱이를 낯선곳으로 옮겨간다는
그런 일차적인 의미뿐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았던 틀 속에서
자유롭게 벗어나고 깨고 나오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우린 늘상 스스로를 얽어매고 산다.
이렇게 얽어 매고 저렇게 얽어 매고,
제 스스로 그렇게 얽매도록 해 놓고서는
세상살기가 괴롭다고 답답하다고 하소연한다.
매일 매일 몇 가지씩, 또 몇 십가지씩
스스로를 얽매는 관념의 사슬들을 만들어 간다.
그건 말 그대로 제 스스로 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때때로 그 틀 속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매 순간 순간 벗어나고,
매 순간 순간 새롭게 일어나야 하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
오랜 얽매임을 좀 더 투명하게 비춰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자
우린 길을 떠나는 것이다.
멀리서 보면
가까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훤히 보이게 마련이다.
늦가을...
나무도 낙엽을 다 떨구었고,
간간이 불어오는 바람에서도 겨울의 소식을 듣는다.
도량 주위를 걷다보면
저 숲 속이 온통 떨어진 낙엽밭이다.
늦가을 바람을 맞고 있자니
저 휑한 바람의 스산함과 허허로움이
내 발길을 재촉하게 만든다.
내 안에 그리움으로 자리하고 있던 곳.
오대산 월정사
그리고 상원사 적멸보궁(寂滅寶宮).
늦가을의 젓나무 숲 그 솔바람 소리며,
솔향 가득한 숲의 내음이
길을 떠나면서
내 안에서부터 먼저 피어오르고 있다.
조금 전까지도 가는 빗줄기가
오다 말다 오다 말다 안개처럼 안개비처럼 내려
이 산의 첫 느낌을 상서로운 생기로 가득하게 맞이해 주었다.
월정사 젓나무 숲은
조금 아껴두고 바라보려고
먼저 상원사로 오른다.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의 길은
아직까지 도로포장이 되어있지 않은,
무조건 개발부터 하고 보는 요즈음 국립공원의 현실에서는
참 보기 힘든 비포장 길이다.
이유야 어찌 되었는건지 모르겠지만
상원사를 오르는 길이 이렇게 비포장이라는 점은
두고 두고 상원사와 적멸보궁 또 오대산을
좀 더 내 마음 안에 포근히 기억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이런 흙길을 요즘 같아서는 좀처럼 밟아보기 힘들다.
특히나 국립공원이나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은
어김없이 쭉쭉 뻗은 포장도로가 잘 뚫려 있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거닐을 수 있는 여유를 박탈하고 있다.
전국의 어느 전통 사찰을 가더라도
차를 몰고 일주문까지 논스톱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 버렸다.
절에 갈 때는 저만치 차를 놓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가야 좀 더 산사의 깨침과 고요를 느껴볼 수 있다.
일전에 경기도 포천의 어느 산사를 찾아간 적이 있는데,
저 아래 주차장에서부터 한 30분 걸어올라가는 숲길이
더없이 푸르르고 생기로왔던 터라
내 속 뜰이 생기를 잃을 때면 이따금 찾아 걸어 오르던 곳이었다.
다른 전통사찰 같은 곳은
관광객들 좀 더 많이 찾아오라고
너도 나도 산길을 뚫어 숲을 망가뜨리면서까지 도로를 만드는 판에
그 절은 오르는 내내 두 발로 딱 버티며 걸을 수 있어 좋았던 곳.
그런데 오랜만에 다시 찾은 그 도량에서
어김없이 도로를 만들려는 작업이 진행중에 있었다.
물론 이런 저런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 속 내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뭐라 말하기 어렵겠지만,
걸어 오르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길을 내겠다고 그 맑은 계곡과 계곡 주위의 큰 바윗돌들을
어마어마한 굉음을 내는 기계로 뚫고 부수는 모습을 보면서
당장 내 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기도 했지만
내 마음은 더없이 그 산사와 떨어져 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이러면서 불교계에서 환경운동을 주장한다는 것이
바깥에서 바라볼 때 얼마나 이율배반적으로 보이겠는가
싶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물론 환경에 대해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는 사람은
그 누구 보다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으며
환경운동이라는 것은 그대로 불법(佛法)운동이고 진리를 실천하는 길이며
이 우주 법계를 그대로 부처님 진리대로 다 맡겨 두자는
수행운동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남이 하면 환경파괴고
내가 하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 잘못된 생각이다.
환경문제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우리부터, 불교계 내부에서부터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법계와 하나가 되는 건축물
도량이 또 하나의 자연이 될 수 있는 생태적인 공간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다.
상원사 오르는 길도 내 생각엔 좀 넓다 싶지만
그래도 도로를 포장하여 흙들이 숨을 못 쉬게 만들지는 않았으니
그나마도 다행스럽다는 이런 생각이 부디 오래 갈 수 있길 바란다.
이런 흙길을 걷는 일들이
누구에게라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럴 수 있도록 흙길 조성에 많은 사람이 힘써 줬으면 좋겠다.
흙길이란 자연을 그냥 놔 둔 길이기 때문에 조성이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이미 인위적으로 만든 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시금 그 길을 자연상태로 되돌려 놓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조성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다.
걷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사람이 두 발로 서서 흙을 밟으며 걷는다는 것은
단지 걷는다는 일차적인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걷는다는 것은
내가 나 자신과 함께 한다는 뜻이고,
명상의 길을 걷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내가 내 존재 근원에게로 다가가는 길이기도 한 것이다.
또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근원적인 운동의 방법이기도 하고,
요즈음에는 여타의 걷기의 과학적 효과가 무수하게 증명되고 있기도 하다.
사람은 걸을 때 비로소 몸의 평형을 유지할 수 있고,
또한 정신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상원사 청량선원의 앞 뜰이
이 산과 조화를 이루며 한없이 고요하다.
법당에서 울리는 나지막한 목탁소리며 스님의 염불소리 또한
이 오대산자락을 그야말로 청량하게 적셔주는 듯 싶다.
선원의 단청하지 않은 담연(淡然)한 모습이며
나란히 성성적적한 깨침의 세계를 언어로 표현해 주고 있는 주련,
그리고 그 아래 선원 수좌 스님들의 검은색 털고무신,
그 뒤로 울울창창 솟아 있는 전나무 숲의 정취하며,
온 산을, 아니 온 법계를 소리 없이 뒤흔드는 깨어지지 않는 화두가
내 안 뜨락을 무겁게 짓누르는 듯도 하고, 환희 밝혀주는 듯도 하고,
수행자로서 나의 앞 길을 틔워주고 있다.
비가 내리고 난 다음이라 그런지
적멸보궁 오르는 길이 더없이 청청하고
사람이 없는 터라 외롭고 호젓한 정취에,
젓나무 사이를 스치는 맑은 솔바람 소리하며
코에서부터 온몸까지 흐르며 짠하게 스며오는 솔향가득한 내음까지
그야말로 부처님을 친견하러 가는 길이
바로 이런 곳이구나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게 된다.
솔향이 이렇게까지 진한 향기로 베어나오는 곳은
아마도 처음인 듯 싶다.
짙은 솔향의 내음에 온몸을 맡기면서
가만히 가만히 걸으며 느껴본다.
빗물 머금고 있는 산숲의 생생함을 눈으로 바라보며
눈에 보여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새들의 지저귐이며 다람쥐들의 짹짹임에서부터
솔바람 소리, 빗물 떨어지는 소리들을 온전히 듣는다.
콧등에 짠하게 내려앉는 솔향을 맡고,
작은 보온통에 다려 온 차 한 잔 한모금 마시면서
몸으로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옮기는 걸음을 바라보며,
간간이 떠오르는 머릿속 생각들을 가만히 지켜본다.
그저 그렇게
눈으로 귀로 코, 혀, 몸, 뜻으로
이 산숲의 경계를 있는 그대로 느껴본다.
느껴지는 것을 그대로 느끼면서 걸을 때
내 마음은 더없는 고요 속으로, 평화로움으로 빠져든다.
가만히 관(觀)하며 걷다가
다른 생각이나 잡념이 떠오르게 되면
순간 내 안의 평화로움이 흩어지게 됨을 바라본다.
이런 경험은 참으로 소중하다.
내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을 때,
아무런 잡념이나 분별들이 올라오지 않고,
다른 시간이나 다른 공간의 일들이 ‘지금 여기’를 침범하지 않을 때
그 때 내 마음은 지고하고 순결한 평화로움 그대로다.
어떻게 말로써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순간 무념(無念), 무상(無想), 무심(無心)이 되어
온 우주 법계와 내 주변의 대자연과 하나되어
그냥 걷기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평화로운 걸음을 내딛으며
흡사 극락의 평화가 이와 같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
그런데 잠깐이라도
다른 공간, 다른 시간의 기억들이 떠오르거나,
잡념이나 번뇌가 순간 일어나게 될 때,
그것들이 일어남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놓치게 될 때
그 때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면서
이런 저런 분별과 분별로 인한 좋고 싫은 감각
좋고 싫은데 따른 애착과 미움들이 올라와
내 마음을 번거롭게 만들고 만다.
이런 경험은 아주 미세하고 작기 때문에
쉽게 경험해 보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런 경험들을 몇 번이라도 아니, 단 한 번이라도 느껴 보게 된다면
누구라도 ‘관’ 수행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난 믿는다.
지금 이 순간을
아무런 분별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느껴볼 때
바로 그 순간이
깨달음의 순간이고, 지고의 행복의 순간이며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온전한 평화로움의 순간이 되는 것이다.
그 때 내 안의 부처가 고개를 내밀어
내 밖의 모든 경계와 온연한 일치를 보게 되는 때인 것이다.
그렇게 한 시간 남짓 걸으며 느끼며 비춰보다 보니
어느덧 적멸보궁의 그야말로 적멸한 고요가 눈앞에 펼쳐진다.
적멸보궁이라 이름 붙어 적멸보궁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모습 그대로가 ‘적멸’이 아니고 무엇이랴.
728x90
반응형
'스님따라 여행가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올 가을 단풍여행 어디로 갈까? 한국 최고의 단풍! 설악 공룡능선 (6) | 2009.10.09 |
|---|---|
| 가을 단풍여행의 최절정, 봉화 청량사 (4) | 2009.10.06 |
| 지리산 산행기, 비오는 산길을 홀로 걷는 즐거움 (2) | 2009.07.22 |
| 눈덮인 태백산과 산사의 겨울 (1) | 2007.12.11 |
| 오대산 적멸보궁을 오르며 (0) | 2007.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