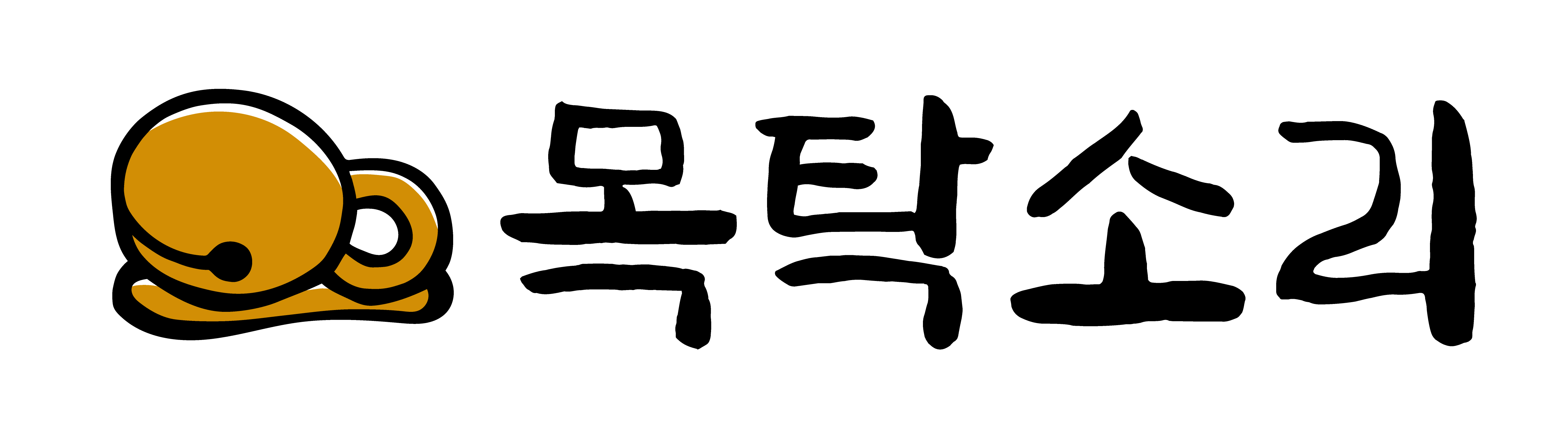양구 읍내가 환히 내려다 보이는
비봉산은
강원도 1000고지 이상의
높은 산들 가운데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는
아주 얕은 봉우리의 산이다.
그야말로 양구에 사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산책하기 알맞도록
자연에서 베풀어 준 산인 듯도 하다.
오후 늦은 시간에
혹은 새벽 예불을 끝내고
터벅 터벅
쉬엄 쉬엄 올라도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까지
1시간 정도의 시간이면 족하다.
어제는 바람이 얼마나 불던지.
귀를 활짝 열고
산 길을 오르는데
여기가 산인가 바다인가 싶을 정도로
거센 바람소리가 파도치듯 귓전을 맑고 차게 스치운다.
조금 춥기는 해도
산에서 부는 파도소리를
온 몸으로 느끼면서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평화로와 지면서
입가에 미소가 살랑살랑 피어오르곤 한다.
처음 강원도 양구로 간다고 했을 때
많은 벗들이
눈 구경 실컷 하겠다고,
추워서 잘 견딜 수 있겠냐고,
걱정어린 눈길을 주곤 했었는데,
한달 넘게 살아보니
여기가 강원도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눈도 적고 그다지 추운 날씨도 손에 꼽을 정도다.
여기 주민들 말씀이
예년에는 이러지 않았다고
작년, 그작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신다.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10년, 20년전하고 비교해 보면
그야말로 세상이 변해도 한참을 변했다고들 하신다.
겨울이 겨울다와야지
겨울이 미지근해지면
우리 몸의 생기도, 대자연 숲의 생기도
함께 미지근해지고 만다.
겨울이 춥고, 눈이 많이 내릴 때일수록
그 다음 해 농사는 더욱 풍성하게 여물어간다.
그래서 그런가
강원도 산에만 가면 늘 눈 속을 걸어야 한다고
산을 좋아하는 내게 아이젠을 선물해 주던
오랜 도반의 조언과는 다르게
이 곳 비봉산도 눈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산 아래쪽에만
길가에 아주 조금씩 하이얀 눈들이
채색하듯 흩뿌려져 있을 뿐이다.

그 대신에
길가 좌우로 이 추운 날씨를 견뎌내며
성성하게 깨인 정신으로
낙옆썩은 흙빛의 땅을 뚫고
초록의 작은 생명들이 근근이 이 겨울을 지켜내고 있다.
겨울에 무슨 초록이냐고 하겠지만
이처럼 겨울 산에도
생명의 숨결은 나즈막하게 호흡을 하고 있다.

겨울 산에서
발 아래 피어난 초록의 생명들을 보자니
미리 봄을 맞이한 듯
내 안에도 설레는 봄의 기운이 가득하다.
지금같이
하루 해가 저물어 가는 숲은
더욱 생기어리다.
겨울의 눅눅한 흙색의 숲들이
지는 햇살의 따뜻하고 노오란 빛을 받아
겨울산을 황홀하게 물들인다.

비봉산 정상.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데
감시초소 저홀로
이 시린 바람을 맞아가며
양구 시내를 내려다 보고 있다.
비봉산 정상
해발 482m

대암산, 대우산, 가칠봉 등
1,000고지가 넘는 산들 사이에서
비봉산은 산이 아니라 그냥 언덕이거나,
어릴적 뛰어놀던 어린이들의 뒷산 놀이터다.
어린이들의 놀이터.
내가 어릴적만 해도
뒷산처럼 놀기 좋은 놀이터가 없었다.
이 산 저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숨바꼭질도 하고, 또 싸움놀이도 하고,
산딸기도 따러 다니고, 산나물도 케러 다니고,
때때로 산토끼를 사냥하겠다고,
혹 어떤 때는 밤에 친구들이 모여서
귀신을 잡으러 가겠다고도 하면서 숲을 헤짚고 다녔다.
또 그렇게 놀다가 지치면
산을 베게 삼아
하늘의 구름을 이불 삼아
때로는 이름모를 산소 위에 올라 가
푹신푹신한 잔듸를 요 삼아 깔고 누워 잠이 든 적도 많았다.
뒷 산 만한 놀이터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지 싶다.
그런데 요즘의 아이들의 놀이터는
더이상 산이 아니고, 들이 아니다.
심지어 아파트 옆에 딸려 있는
놀이터에서 조차 어린이들을 보기는 어렵다.
어디에 있냐?
다 좁은 골방 안에 앉아 있고,
그 좁은 모니터 앞에 죄다 모여 있다.
그 모니터 앞에서 친구도 사귀고,
공부도 하고, 만화도 보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도 어른들도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잃어가고 있다.
어른들이 먼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빠져 나가야 한다.
집에서 빠져 나와 뒷 산으로 들어가야 한다.
매일 매일 적어도 몇 시간씩은
집을 벗어나, 학교를 벗어나
산으로 들로 밖으로 나가야 한다.
숲에 깃들 때마다,
바람을 깊숙이 빨아들일 때 마다,
흙과 나무를 맨발로 두 손으로 쓰다듬을 때 마다
우리는 건강과 평안과 깨어있는 정신을 선물받게 된다.
집에만 머물러 있으면,
좁은 골방에만 갇혀 있거나
딱딱한 의자 위에 앉아 모니터만 쳐다보고 자판만 두둘기고 있으면,
우리의 몸도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정신도 심각한 이상을 앓게 되고야 만다.
핸리 데이빗 소로우는
'집은 일종의 병원'이라고까지 했다.
또 옛 사람들은
사람이 흙과 가까이 할수록 병원과는 멀어지고
흙과 멀어질수록 병원과는 가까와진다고 했다.
집을 빠져나가는 일은
그래서 저 산으로 뛰어드는 일은
한 편으로 얼마나 고된 일이며 귀찮은 일인가.
그러나 왜 집 나가길 주저하는가.
왜 늘 방 안에만 틀어박혀 안주하려 드는가.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것이라면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만도 족하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아니 나 자신에게
자연을 선물 해 주자.
뒷 산의
소박하지만 생기로운 놀이터의 추억들을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일깨워주자.
우리 집, 우리 마을의
뒷 산을 우리 손으로 소중하게 지켜내야 한다.
뒷 산의 놀이 문화를
우리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
비봉산을 오르며,
어릴 적 내가 살던 마을의 뒷산 모습이
아름다운 수채화를 보듯 뚜렷하게 그려진다.
뒷 산에서 산불이 났을 때
집집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을 뿌리치고
모두들 삽자루, 빗자루, 물통을 짊어지고
너도 나도 산으로, 불길 속으로 뛰어들던 장면은
두고 두고 우리 마을의 아름답고 살풋한 정감어린 기억으로 자리잡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두 모이기가 참 어려웠는데,
더구나 저마다의 일들로 다들 바쁘곤 했는데,
뒷 산에 산불이 나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들 우루루 몰려들어서는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을 이루며
뒷 산을 지켜내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눈물어린 감동으로 남아 있는지 모른다.
나는 그 날
아버지를 다시 봤다.
아버지는 늘 차갑고 무섭고
다른 일에는 관심도 없이
오로지 일에만 집중해 계시는 모습이 내가 본 아버지의 모습이었는데,
그 날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산에 올라가
그 매서운 불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을, 숲을, 우리의 놀이터이자 마을의 삶터인 뒷 산을 그렇게 지켜내셨다.
지친 듯 산을 내려오시는 아버님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감동스럽던지.
그리고 우리 마을의 어르신들이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그렇게 우리 마을의 어르신들은
뒷 산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지켜내셨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낸 뒷 산 언덕 위에서
우리는 또 다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다.
그렇게 뒷 산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며 자란 어린 아이가
훌쩍 자라 어른이 되면서
잠시 동안은 자연을 뒤로하고
사회에서 학교에서 시키는대로 공부도 하고
입시전쟁도 치르고, 취직하느라 고생도 하겠지만,
그렇게 초록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자란 어른들은
다시금 늙어가면서 산을 찾고
깃들어 살 숲을 그리워하게 된다.
그런 어른들이
환경파괴를 걱정하며 숲도 지키게 되고,
원흥이 방죽을 걱정하며 지켜내게도 되고,
멀쩡한 산을 뚫어 터널을 만드는 일에 왜 반대를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며,
발전과 개발의 논리 보다는 보존과 놓아 둠의 논리를,
또 부자보다는 지혜로운 가난의 정신을 지키게도 되고,
나아가 산과 숲의 정신을
우리 인간의 마음에 일치시키는 선의 길, 명상의 길에도
밝은 원력을 투영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비봉산 정상.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면서
이 아름다운 강원도의 자연을 내려다 보면서
언젠가 이 곳까지도
개발과 발전의 논리가 지배되어
모든 사람들의 눈에 선량한 눈빛이 사라지고
독이 오른 부와 개발과 성공을 향한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
괜한 거겠지?
아직 소나무는 푸르다.
햇살도 아직 건너편 산봉우리를 넘지 못했다.
생기어린 창창한 소나무 숲.
그 사이로 새어나오는 저녁 햇살의 따스함.

앙상한 소나무 숲 사이로 난
길.
숲 길.

발걸음이 산 아래로 내려가면서
서산으로 떨어지는 태양이
나뭇가지에 걸렸다.

그리고는 곧장 곤두박질.
태양의 여운은 뜨겁다.
태양이 사라진 자리에서
앙상한 겨울 가지 끝에
단풍잎 하나.

고개를 돌려 내려온 산을 바라보니
비봉산 하늘 위에서
태양과 맞교대를 하고 막 뛰쳐나온
달.

노을의 여흥이
달 아래
구름을 녹녹히 덥혀주고 있다.

태양빛이 달님을 맞이하는 순간.
오늘 밤
달빛, 별빛은
더없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다.
| | | |